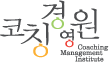| ||
‘마흔이 넘고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 대통령의 말이다. 타고난 용모가 아니라 살아온 궤적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뜻이리라. 모 작가는 매년 셀카 사진을 통해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도 했다. 이 역시 용모가 아닌 인상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화가의 자화상은 시기별, 나이별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그 가운데서도 렘브란트는 독보적이다. 63세로 생을 마치기까지 그는 무려 8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다. 2019년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라익스뮤지엄에 갔을 때 마침 그의 서거 350주년을 기념해 ‘렘브란트의 모든 것’이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덕분에 그의 초기작부터 말기작까지 초상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20대 초반, 재능이 드러나며 세상의 조명이 비치기 시작한 시기. 솜털 보송보송한, 풍차마을 천재 소년의 모습에선 한편으론 부끄러움이, 한편으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난다. 말 그대로 젊은 날의 초상이다. 30대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눈부시다. 의복과 태도가 확 달라졌다. 화려한 망토와 금빛 사슬을 두르고, 왕자처럼 화면 속에 등장한다. ‘나는 거장의 후예다’라는 기세와 서슬이 그림 밖으로도 뻗쳐 나온다. 렘브란트의 인생을 알기에 그의 과잉 자신감은 위험 경고로 조마조마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40대 불혹의 문턱에서 렘브란트의 얼굴은 또 달라 보인다. 사랑하는 부인 사스키아의 죽음, 사업 실패, 재정 몰락이 잇따르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의 고난시기. 귀족적 연출은 줄고, 대신 어두운 배경과 묵직한 눈빛이 자화상을 채운다. 한때 정면을 응시하던 눈은 이제 내면을 탐색하거나 관조한다. 공자가 말한 불혹(不惑),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고통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붙잡는 힘이다. 50대는 남들의 시선보다 나의 시각으로 살아야 하는 대전환점이다. 50대 중반 「사도 바울 풍으로 그린 자화상」 속 렘브란트의 눈빛은 더 이상 세상을 우러르지도, 맞서지도, 내리깔지도 않는다. 사명을 받아들인다. 이 작품은 지천명 선언이다. 사도 바울이 편지와 설교로 진리를 증언했듯 자신은 인간의 진실을 그림으로 증언하겠다고 선언하는 듯하다. 젊은 날의 화려함 대신, 깊은 주름과 무거운 시선, 붉은 옷 속에 담긴 사도의 고난과 자기 성찰이 배어 나온다. 번쩍이는 광채는 조용한 관조의 눈빛으로 변해 있다. 그는 인생 후반전에 다시금 “나는 왜 (팔리지 않더라도)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를 묻지 않았을까? ‘하느님이 내게 그림이란 재능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자문하면서. 60대 이순의 고요. 생의 마지막 해에 그린 최후의 자화상은 단순하고 담백하다. 흰 머리칼, 깊게 팬 주름, 커다란 딸기를 닮은 주먹코. 30대의 기세등등 야심가와 한 인물이 맞나 의심될 정도다. 공자가 말한 이순,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화해다. 들을 것 듣고, 거를 것 거르면서 세상과 화해를 넘어 자신과도 화해한 모습이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거울이 된다. 30대의 당당함, 40대의 흔들림을 건너 50대의 묵묵한 장인으로, 마침내 60대의 세상을 넘어 자신과 화해하고 평온을 되찾는 얼굴.... 성공이 사라져도 성숙은 남는다. 얼굴은 속이지 않는다. 살아온 궤적과 사유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인생 2막은 더 이상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의 시간이다. 문득 질문을 던져본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떤 삶의 궤적을 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더라도 감수할 만큼 지키고 싶은, 혹은 지켜야 할 ‘내 삶의 이유-목적-가치’를 붙잡고 있는가? 앞으로 10년 후, 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 칼럼에 대한 회신은 blizzard88@nave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