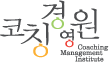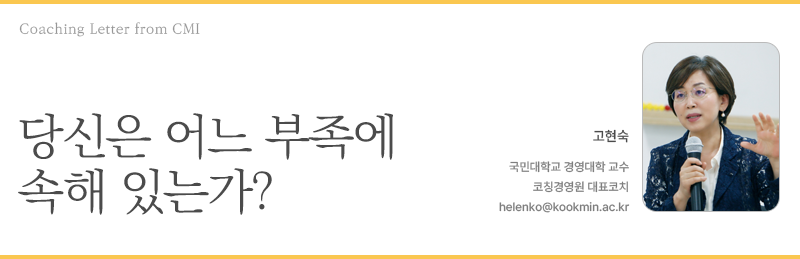 | ||
나는 나이 30대 후반까지도 인생이 혼란스러웠다. 남들은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같고 다들 자기 자리를 찾아 정착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니었다. 대학 졸업을 남들보다 늦게 했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할 기회를 놓쳤다. 하는 수 없이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번역 일도 하고, 프리랜서 기자도 하고, NGO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선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신제품 기획과 마케팅을 하게 되었다. 정규직 직장인이 되었고 나름 성취감을 맛보며 일했다. 그사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바쁘게 사는 워킹 맘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것으로 나의 허기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전공 분야’나 ‘업계’가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연결이 없으니, 직장에는 다녔으나 이름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어떤 교수님 사단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부러웠다. 어떤 이가 호텔 마케팅계에서 유명하다는 말도, 전략 컨설턴트라는 표현도 귀에 꽂혔다. 그들의 사회에는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흘러 다니는 사람인가. 그즈음 큰아들의 학원을 알아보느라 과학 전문학원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상상치도 못했던 대학 동기를 만났다. 학교 다닐 때 ‘물리의 신’이라는 칭송을 받던 천재가 과학고 전문 입시학원 교사가 되어 있었다. 늦은 저녁 중국집 배달 음식으로 식사하는 그 친구 옆에 앉아서 아, 우리는 왜 이렇게 떠다니고 있을까, 언제까지 떠다니게 될까. 차마 말은 못 하고 혼자서 생각했다. 이 친구도 외롭겠구나. 소속감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부족(Tribes) 나의 부러움과 허기가 해결된 건 한국리더십센터라는 회사에 조인하고 나서다. 리더십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주력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리더십 교육이 대표 상품이었다. 시간 관리 교육도 하고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도구를 판매했다. 효과적인 삶과 원칙 중심의 리더십 교육이 주였다. 조직의 사명도 분명했고 사람들의 삶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한다’는 이상적인 원칙이 그곳엔 있었다. 일을 하고 월급 받는 직장 동료들이지만 쓰는 언어가 같아지고, 가치관과 지향점을 자주 얘기하다 보니 진정한 동료라는 느낌이 들었고, 소속감이 생겨났다. 나의 정체성도 소속감 속에서 강화되었다.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느낌이 드디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부족에 소속된 것이다. 현대는 외로움의 시대다. 익명성의 사회이고, 우리는 거대 다수의 아이디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는 사람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다. 정체성을 갖는 데는 그래서 소속할 대상이 필요하다. 세스 고딘(Seth Godin)은 책 『트라이브스(Tribes)』에서 부족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원시 부족이 지리적 혈연적 특성에 따라 형성되었다면 오늘날의 부족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진화된다. 마케팅의 그루인 그는 지금 같은 마케팅 혐오의 시대(오로지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에 이제 마케팅은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커뮤니티, 즉 부족에 뿌리내리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다. 지난 주말 내가 속한 국민대 경영대학원의 리더십과코칭 전공 학생들의 워크숍에 갔다. 재학생도 졸업생도 함께한 그 힐링 워크숍에서 나는 부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니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코칭 부족’이라고, 그들은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부족 안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연결성이 있다. 그가 무엇을 견디고 있고 무엇에 도전하고 있는지 안다.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자 거기서 안전감이 나왔다. 당신은 어느 부족에 속해 있는가? * 칼럼에 대한 회신은 helenko@kookmin.ac.kr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PREV [허승호] 영문도 모르고 입문했는데
-
NEXT [한근태] 운동이 우리를 구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