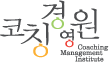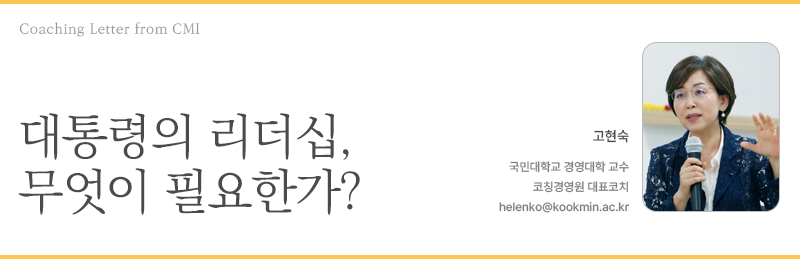 | ||
지난 4월, 대통령 탄핵 직후였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 상황을 리더십 전공자로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거대한 리더십 실패를 막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대답은 다양했다. 어떤 대답에 대해서 나는 다소 냉정하게 되물었다. "가십과 소문에 기대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만다면, 그런 인식 수준으로는 무엇이 올바른 리더십인지 평가할 기준이 없지 않나?" 찌라시 수준의 평론이 아닌 전공 학생다운 진지한 탐구심을 주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수업에서 토론된 내용은 다양했다. 리더 개인의 인성, 관계의 천박성, 국민의 삶에서 성과를 내지 못함, 대중과 동떨어진 정치집단의 인식과 야당과의 정치 역동, 민주주의를 그렇게 손쉽게 훼손할 수 있는 권력 집중 구조 등이다. 다양한 대답들은 학문적으로는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에 따라 나눌 수 있겠다. 첫째 개인 차원으로 인성과 가치관, 역량 등이 거론된다. 둘째 팀 차원의 문제로서 측근 세력과 내부 정치와 정당을 포함한다. 셋째는 조직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 리더십의 경우 국가의 비전과 변화 전략 등일 것이다. 리더십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집단이 이루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리더십이라는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 리더십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공통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실행을 이끄는 것이다. 대통령 리더십은 일반적 정의 외에 특수성이 있다. 일단 엄청난 복잡도를 다뤄야 한다. 또 결정적으로, 항상 자신을 반대하는 일정한 국민과 그들을 대표하는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역량 리더십 연구자 프레드 그린슈타인은 책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The Presidential Difference』 (2000, 위즈덤하우스)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대중의 호응을 얻고 정책 결정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가를 미국 역대 대통령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6가지 역량으로 정리했다. 대중과의 의사소통, 조직 능력, 정치력, 통찰력, 인식능력, 감성지능이 그것이다. 그는 루스벨트부터 클린턴까지 11명의 미국 대통령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루스벨트는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났다. 감동적인 그의 연설은 대중의 믿음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케네디 대통령 역시 대중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했다. 대통령에게 감성지능이 왜 필요할까?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자신을 객관화하는 자기 인식능력, 둘째 분노나 불안을 다스리는 자기 조절 능력, 셋째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 등이다. 이렇게 쓰고 보니 유난히 감성지능이 떨어졌던 우리의 실패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떠오른다. 닉슨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엘리트여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소련과의 화해를 이루는 등, 정치적으로 천부적인 자질을 보였다. 하지만 초기에 잘 다루면 작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빠져 파멸을 초래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감성지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그린슈타인은 진단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 리더들은 제발 이 여섯 가지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성찰해 보았으면 한다. 자신 없으면 리더십 코치를 두어 도움을 받기 바란다. 한국에는 유능한 리더십 코치들이 적지 않다. 비전의 힘 최근 우리나라의 리더십 실패에는 비전의 부재도 크게 작용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비전은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아주 잘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가?’에 관한 답이다. ‘통일 한국’ 정도는 모두가 얘기하지만 그건 부족하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북유럽 국가인지, 싱가포르처럼 되고 싶은지, 세계 속에 어떤 나라로 자리 잡을지 비전이 국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은 한때 ‘서부의 하버드(Harvard of the West)’라는 단순한 비전을 내세웠다. 비전이 하버드대학이니, 교수의 수준, 학생의 수준, 학교 시설이 어때야 하는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 결과 세계 1, 2위 수준의 대학이 되었다. 비전의 힘이다. 거대한 실패에는 반드시 우리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시스템 전체에서 무언가 잘못된다는 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수많은 정치 리더들, 지식인들, 사회 구성원들도 단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돌아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선에서 지역감정이나 정파적 선호도가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 역량을 평가 잣대로 삼고 표를 행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칼럼에 대한 회신은 helenko@kookmin.ac.kr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