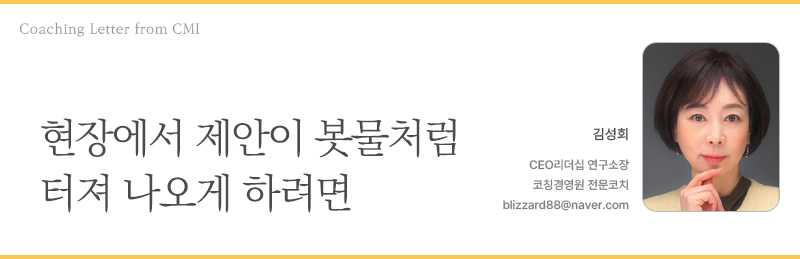| ||
'심리적 안전감'이란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 그 어떤 의견을 제기해도 벌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조직 환경을 뜻한다. 어디 요즘뿐인가. 왕조시대 때도 임금은 의견을 절실히 청했고, 예전 라떼상사들도 야자타임을 마련,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청하고자 했다. 예나 지금이나 리더들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라”라고 목놓아 말한다. 이때 심리적 안전감을 갖고 이야기했다가 ‘피 본’ 이들의 피해담이 동서고금 속출하긴 했지만...왜 현장의 목소리는 리더 앞의 벽에서 머물고, 그들은 입을 다물까. 원인은 3무(無) 때문이다. 무력, 무익, 무시다. 구성원의 무력(無力)은 짐작하듯 상사의 무력(武力)에 비례한다. 파워 디스턴스에서 빚어지는 두려움, 어려움이다. 이 3무를 없애야 조직이 산다. 현장의 소리가 위로 올라온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직원들의 장기근속이 증가하고 성과도 좋아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리더로서 용기 있는 대변자의 모습을 보여주라. 무슨 의논을 할 때 예산, 상황 문제 등의 핑계를 매번 대며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냐’의 참새론 혹은 ‘내가 무슨 힘이 있냐’는 오리발로 결론나면 침묵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다. 머리 짜내고 입 아프게 이야기했는데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돈, 시간, 인력이 든다. 윗선에서 불편해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건드리거나 대변해 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너희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냐’고 아무리 닦달해 봤자 더 움츠러들 뿐이다. 자신의 사수가 옹호자, 대변자란 신뢰가 형성되어야 일선 직원의 입은 열린다. 둘째, 파워 시그널을 없애라. 목의 깁스를 풀라. ‘켈의 법칙(Kel's Law)’에 따르면 직급이 한 단계 멀어질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진다. 동료 간 거리가 1일 때, 직원과 상사와의 거리는 2이고, 심리적 거리감은 4이다. 이것을 인지하려는 노력과 그 간격을 좁히는 구체적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직원이 앞에 있는데 큰 하품과 기지개, 푹신한 의자 등받이에 기대는 행위, 핸드폰, 컴퓨터 모니터를 수시 체크하는 것 등이 모두 거리감을 유발한다. 알게 모르게 상사가 파워 시그널을 보내는 한, 직원들은 ‘닥충’(닥치고 충성)을 외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조직에 만연한 파워 시그널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제거하라. 권력 신호 없애기가 먼저다. 셋째, 정기적으로 만나고 주도적으로 다가가라. 의례가 아닌 의도가 중요하다. 진정성을 보이라. 얼굴을 대면하는 대화 자리를 자주 마련하라. 안건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라. 단순히 개방적인 자세만으론 부족하다. 주도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커리어 패스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대해 논의하라. 넷째, 후속 조치를 취하라. 경청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실행이다.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가시적 조치를 보여 주는 게 필요하다. 가이드라인과 책무를 처음부터 명시함으로써 직원들이 그 계획에 기여하는 일이 힘들고 무익하다는 느낌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 제안, 공헌자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보상이나 인정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응은 보여주라. 그래야 발언의 물길은 형성된다. 결국 직원이 묵언을 할지, 방언이 터질지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문제다. * 칼럼에 대한 회신은 blizzard88@nave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PREV [한근태] 가정의 오버헤드
-
NEXT [고현숙] 당신의 공감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