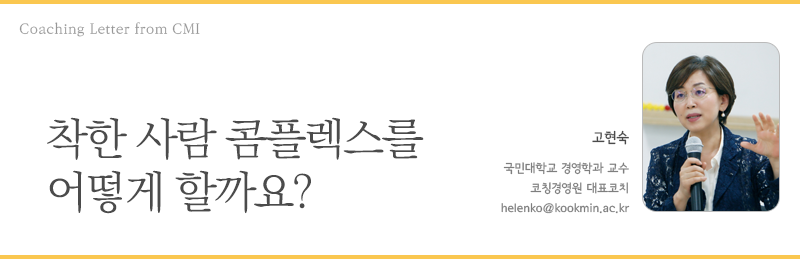 | ||
한 잡지사의 의뢰로 한동안 지면 코칭을 했는데, 한 번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어쩌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금융사에서 일하는 O 대리입니다. 창구 담당으로 5년째 일하고 있는데, 평소 인내심 많고 친절한 성격이라 고객 대응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동료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남의 일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 코칭의 한계는 있지만 나는 이렇게 썼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코칭을 해주시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경계(boundaries)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스스로 경계를 정한다면 어디까지로 정하고 싶습니까? 배려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어디부터는 지나친 것인가요? 주위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거리낌 없이 떠넘기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보십시오. 경계를 정할 때 우리는 더 자신감 있게, 더 건강하고 충실하게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계는 한번 정했다고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역량과 역할에 따라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습니다. 또 경계를 혼자 정하지 않고 상사, 동료와 소통하며 정해도 좋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경계가 없으면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고 주위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과 같지요. 경계를 정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성장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차분하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그 이상을 하려면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냉정하고 못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오히려 자신의 요청도, 상대방의 상황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른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의존성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착한 사람, 도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해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무리한 청을 거절한다고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과 일을 통해 기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조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경계를 정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십시오. 희생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기보다는 넘치는 부담은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십시오.」 * 칼럼에 대한 회신은 helenko@kookmin.ac.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PREV [김종명] 재능은 작용이다
-
NEXT [김대희] 질주본능과 삶의 여유
